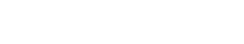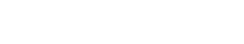[박현모의 세종이야기 제9호] 대결국면 푸는 설득의 기술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9-03
- 조회402회
- 이름관리자
본문
“토론을 즐기는[樂於討論 낙어토론] 임금.” 세종에게 신하들이 붙여준 별명이다. 그는 말끝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으며 인재들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냈다. 논의 중에 좋은 의견이 나오면 그것이 흩어져 사라질까 두려워 곧바로 시행에 옮기려 했던 임금, 그가 바로 세종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토론을 중시한 세종이라도 논의의 대상에서 비켜 세운 주제가 있었다. 불교 문제나 종친 문제처럼, 민생과 직접 연관이 없어 보이는 사안들이 그랬다.
세종은 언관들이 양녕대군이나 효령대군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리면 대체로 무시했다. 내용이 진부하다며 되돌려 보내기도 했다. 재위 9년째인 1427년, 사헌부 관리들이 양녕의 장남 이개에게 내린 ‘순성군’ 작위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아버지가 죄인의 신분으로 유배되어 있는데 그 아들에게 벼슬을 줄 수는 없다는 논리였다. 여기에 사간원 관리들까지 합세해 연명으로 취소 상소를 올리자, 세종은 마침내 “경들이 이처럼 강하게 잘못이라 하니 이개를 도성문 밖으로 내보내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토론의 경계와 세종의 침묵전략
하지만 세종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오히려 경기도 이천에 유배되어 있던 양녕을 서울로 불러올렸다. 곧 있을 세자 혼례에 집안 어른들이 모여야 한다는 이유였다. 언관들은 뜻이 관철되지 않자 이번에는 화살을 왕의 측근 신하들에게 돌렸다. 형조판서 신개와 우의정 맹사성이 그 대상이었다. 임금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하는 대신(大臣)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었다. 그러나 왕은 여전히 침묵으로 대응했다. 그러자 사헌부 관리들은 아예 관청 문을 닫아걸고 전원 사직 상소를 올렸다. 사사로운 은정을 끊든지, 아니면 자신들을 파직시키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압박이었다
‘양녕정국’이 군신 간의 기 싸움으로 비화하고, 자칫 국정 마비로 이어질 조짐이 보이자 세종은 “내 다시 생각해보겠다[予更思之]”며 신하들을 편전으로 불러들였다(세종실록 9년 5월 11일). 그 자리에서 신하들은 태종의 유훈을 내세웠다. 곧, “양녕 문제는 조짐이 자라기 전에 차단하라”는 가르침에 따라 하루빨리 유배지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는 요청이었다. 그러나 세종은 단호했다. “경들이 아무리 불가하다 말해도 나는 따르지 않겠다.” 신하들 역시 물러서지 않았다. “이 일은 국가의 중대사에 관계되므로, 반드시 전하의 허락을 받은 뒤에야 그만두겠습니다.” 끝까지 버티겠다는 결기를 보였다.
자기주장을 내려놓을 줄 아는 용기
대결 국면이 좀처럼 풀리지 않자, 마침내 왕이 타협안을 내놓았다. “내 마음 같아서는 형(양녕)을 매일 만나고 싶지만, 경들이 이처럼 반대하니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 자주 만나지 않을뿐더러, 만약 부득이하게 만날 일이 생기면 “반드시 먼저 경들에게 알리겠다”는 약속까지 덧붙였다. 그러자 신하들은 한목소리로 “그 말씀은 이제껏 듣지 못했던 분부[前日未聞之敎 전일미문지교]”라며 받아들였다. 궁궐문 앞에 엎드려 있던 여러 대간들도 이 소식을 전해 듣고는 “성상의 뜻이 이처럼 간절하고 지극하니, 신 등도 물러가서 다시 생각해 보겠다[退而商量 퇴이상량]”고 말하며 물러갔다(세종실록 9년 5월 22일).
5개월 동안 이어진 세종과 신하들의 대치 국면을 읽으며 두 가지를 새삼 느낀다. 첫째, 매듭을 묶은 사람이 먼저 푸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結者解之 결자해지]는 점이다. 양녕을 불러들인 조처가 갈등의 발단이었던 만큼, 세종이 ‘내가 다시 생각해 보겠다’며 말문을 연 것은 지극히 적절했다. 둘째, 자기주장을 내려놓을 줄 아는 용기다. 세종이 ‘경들에게 먼저 알리겠다’고 다짐하고, 신하들이 ‘신 등도 물러가서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화답한 장면은 우리 역사에서 좀처럼 보기 드문 풍경이다.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세종은 실로 협상의 대가였다. 재위 26년째인 1444년 1월, 흉년을 이유로 축성(築城) 중지를 요구하는 언관에게 세종은 먼저 “너희 말이 그럴 듯하다”고 화답했다. 전년도 흉작으로 고통받는 평안도에 임시 파견관리인 경차관(敬差官)까지 파견하는 마당에, 성을 계속 쌓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었다. 세종은 언관의 말에 일단 수긍하는 반응을 보임으로써 그 주장의 가치를 인정했다.
그러나 성 쌓는 일을 중단할 수는 없었다. 이미 각 지역에서 많은 인력을 동원했고, 물자도 쌓아둔 상태였다. 세종은 “이곳에 머물러 전해 들은 말이 어찌 황보인이 현장에서 직접 본 판단보다 앞설 수 있겠는가”라며, 축성 지휘관 황보인의 보고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오로지 빨리 끝내기만을 일삼는[務欲速成 무욕속성] 태도는 잘못”이라며 성급한 추진의 폐해를 인정했다(세종실록 26년 1월 22일).
경청과 수긍, 그러나 마지막엔 원칙
그러자 언관은 나라의 큰일인 성 쌓기를 아예 중단하자는 게 아니라, 우선 정지했다가 가을 수확 이후에 재개함이 좋겠다고 주장했다.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의견이었다. 세종은 그 말을 끝까지 경청한 뒤, 특유의 화법, 곧 ‘수긍 후 반론’으로 응수했다. “네 말이 옳다, 하지만 사람을 쓰는 도리는 일을 맡겼으면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려면 맡기지 말아야 한다[任則勿疑 疑則勿任 임즉물의 의즉물임].” 언관들도 부정할 수 없는 인재 등용의 일반론을 들어 축성 중지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내가 보기에 세종다움, 곧 신하들의 마음을 움직인 말은 그다음이었다. “다른 날 너에게 일을 맡겼다가 남의 말을 듣고 그 명령을 거두면 네 마음은 어떻겠느냐.” 입장을 바꿔 생각하게 함으로써, 더 이상 반대를 고집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다. 세종은 나아가 실질적인 대책도 내놓았다. 경차관 파견을 취소해 지방 관리들이 접대에 힘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고, 대신 관찰사로 하여금 진휼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감독하게 했다(세종실록 26년 1월 24일). 반대 의견을 단순히 누른 것이 아니라, 역지사지(易地思之)하도록 이끄는 한편, 합리적인 대책으로 균형을 잡은 것이다.
세종의 협상력이 빛을 발한 또 다른 사례로 소헌왕후로 하여금 죄인 신분의 친정어머니를 만나게 한 일을 들 수 있다. 재위 6년째인 1424년 11월, 세종은 유정현 등 여러 정승을 불러 여흥부원군 민제 이야기를 꺼냈다. “나의 외조부 민제의 네 아들이 모두 죄인으로 죽어 제사 지낼 사람이 없으니 민무구의 아들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게 하면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신하들은 “죄는 죄대로 다스리되, 선세(先世)를 위해 후손을 세워야 한다”며 세종의 제안에 찬성했다.
역지사지와 공감의 설득
세종은 이어서 “이미 사망한 심덕부의 경우는 어떤가”라고 물었다. 왕비의 친정아버지 심온의 형제가 ‘강상인 옥사’ 때 모두 사망해, 왕비의 외할아버지 심덕부를 제사 지낼 사람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신하들은 “심씨는 죄가 중하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며 반대했다. 민제의 사례와 비교하면 공평하지 않다고 반박할 수도 있었지만, 세종은 그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중궁의 모친이 지척에 있으면서 서로 보지 못한 지 벌써 7년”이라며 모녀의 정을 고려해, “그 어미로 하여금 궁궐에 들어오게 할 수는 없으나, 중궁이 궐 밖으로 나가 서로 만나게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신하들은 “왕비를 죄인과 만나게 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세종은 기다렸다는 듯, “중궁이 어려서부터 외조부 안천보의 집에서 자라 은의가 지극히 두텁다. 지금 안천보가 나이가 많아 중궁을 보고 싶어 하니, 중궁으로 하여금 그 집에 나가 보게 하면 어떻겠는가”라고 물었다. 신하들이 머뭇거리는 틈을 타, 세종은 다시 한 번 제안했다. “그 집으로 중궁이 가서 외조부도 만나고, 어머니 안씨도 만나게 하면 어떻겠는가.” 그러자 신하들은 모두 “그렇게 하면 가하다”라고 화답했다(세종실록 6년 11월 2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을 자연스럽게 조성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스스로 수용하게 만드는 세종의 협상 역량이 잘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위의 세 가지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세종은 경청과 역지사지의 설득력을 활용해 신하들이 스스로 납득하도록 이끄는, 설득의 군주였다. 그는 종친 문제처럼 민생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들이 국정 운영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폈다. 대치 국면에서는 먼저 신하들의 말을 경청하고, 자기 입장을 내려놓는 유연함으로 설득했다. 축성 논쟁에서는 경청–반론–역지사지–실질적 보완책의 순서로 언관들의 반대를 극복하며 축성 사업을 마무리했다. 소헌왕후의 친정 방문 사건에서도 동일한 패턴, 즉 경청과 역지사지의 협상술을 구사했다.
첨예한 갈등 속 오늘, 세종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단순하다. 먼저 스스로를 내려놓고 경청하라. 공동의 목표를 제시하고, 쇠심줄 같은 인내심으로 설득하라. 마지막으로 실질적 보완책을 더해 모두가 만족하는 결실로 이끌어라&